1960년대의 파리. 30세 가량의 루실은 50대의 재력가 샤를과 함께 살고 있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이던 40세의 디안은 10년 어린 미남 앙트완을 사귀는 중. 어느날 이들은 모두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 만나고, 루실과 앙트완은 동년배인 자신들 둘만이 그 모임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는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된다.

재미있는 소설을 읽은 지가 꽤 오래됐다는 생각이 든다(생각해 보니 소설 자체를 읽은지가 좀 됐다). 우연히 손에 들어온 주황색 표지의 책. 얼마전 재미있는 드라마의 기준 이야기를 하면서 ‘2배속으로 볼 수 없는 드라마’를 조건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패배의 신호>는 얇지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 사실 프랑수아즈 사강이 이렇게 놀라운 작가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오래 전, 어딘가 중역의 냄새가 짙은 <슬픔이여 안녕>이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읽었을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혹은 <슬픔이여 안녕>을 썼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노련함이 깃들어 있다. 사강이 딱 30세였던 1965년에 쓰여진 책인데 30세로 설정된 루실보다는 40세 정도로 설정된 디안에게 뭔가 더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파티다. 소설 내내 '파티'라고 이름붙여진 상류층의 관찰 게임이 등장한다. 모든 참석자는 연기자이면서 관객이다. 모두가 모든 사람을 보고 있다. 노련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잘 알고 있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려 노력한다. 참석자들 사이에는 이미 경제/사회적인 우열과 의존의 관계가 있고, 모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돈과 인기, 즉 매력을 다 갖춘 플레이어들은 최강자이므로 이 게임을 주도할 수 있다. 물론 전제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암묵적인 룰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샤를과 디안은 오랫동안 이 게임의 강자들로 군림해왔지만, 불행하게도 룰을 인정하지 않는 두 젊은 플레이어들을 이 무대로 끌어들인 탓에 그 댓가를 치르게 된다. 그 무대에선 ‘무슨 짓을 해도 좋았던’ 자신들의 오랜 입지가 흔들리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젊음에 대한 동경'을 포기하지 않은 댓가다.
‘디안은 전날의 사건이 완화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클레르는 안하무인인 디안이 무슨 변덕인지 정오에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는 말을 퍼뜨릴 수 있었다. 디안은 파리에선 기본이 되는 이 원칙을 잊었다. 바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절대 사과해선 안 된다는 것과, 꺼림칙하게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것.’
<패배의 신호>를 읽는 것은 잘 부스러지는 여러 겹의 페스트리 빵을 먹는 것과 같다. 손 대기 무섭게 부서져내리는 내리는 부스러기 하나 하나에 모두 감춰진 의미가 있다. 모든 이들이 모든 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 하나를 해부하는 사강의 시선은 ‘섬세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구석이 있다.

스스로 패배로 인정하지 않는 결말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샤를, 자기가 아는 단 한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는 앙트완을 그리는 붓끝도 선명하지만 두 여주인공, 루실과 디안을 그려내는 필치는 실로 감탄을 자아낸다. 낮에 앙트완과 밀회를 즐기고, 헤어지기 아쉬워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지만, 그 사이 저녁 파티에서 예기치 않게 앙트완와 마추쳤을 때에는 약간 번거롭게(?) 느끼는 루실. 앙트완과 루실의 관계를 짐작하고 슬퍼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루실을 인정하는 디안.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읽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샤를에게서 키다리 아저씨의 잔상을 볼 것이고, 어떤 이들은 디안의 우울에서 동질감을 겪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루실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볼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디안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볼 지도 모른다. 물론 루실과 디안이 모두 자신의 과거였던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재미있게 읽힐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생을 아는 사람에겐 더 많은 것이 보인다.
(일각에서는 샤를을 '포용하는 사랑'의 주체로 해석하는 듯 하지만, 나이 먹어 이 책을 읽고 보면 결국 샤를의 태도는 포용이라기보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과연 샤를의 입장에서 앙트완과 무슨 경쟁을 하든, 정면 대결을 한다면 패배는 불보듯 뻔한 상황. 이럴때 뒷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앙트완이 '백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노회한 지혜가 아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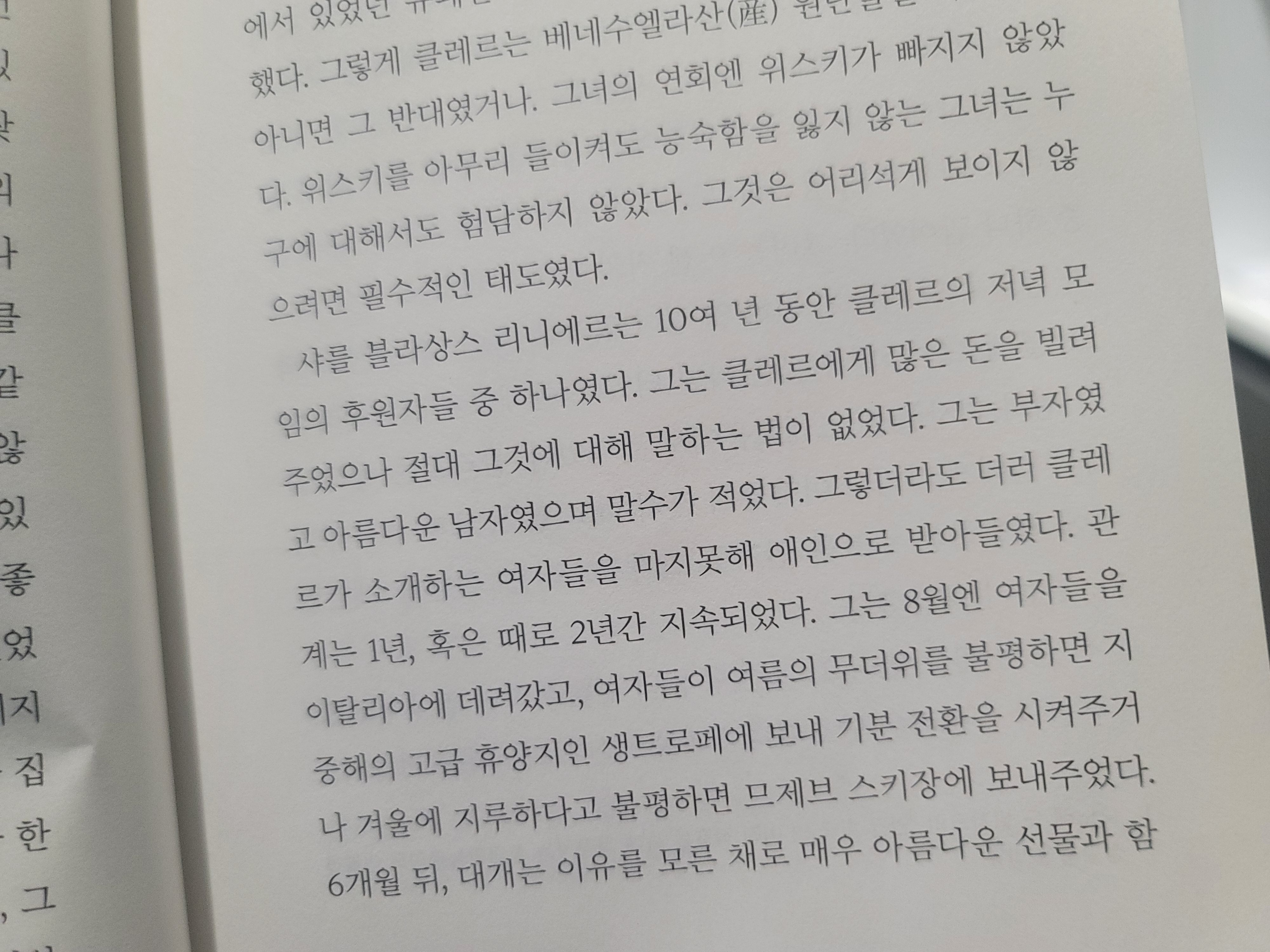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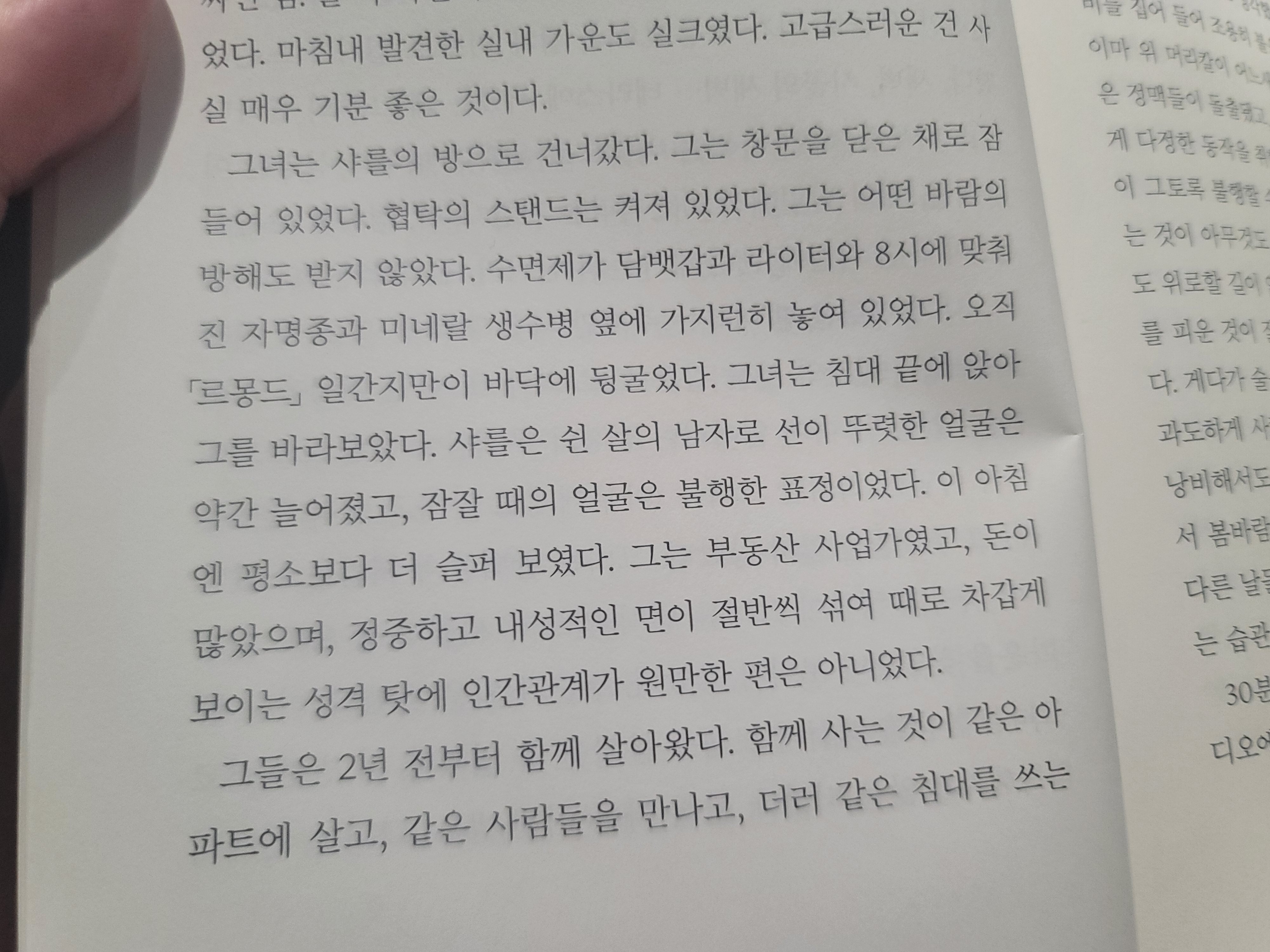
분명한 것은 아무도 사강에게 동정을 기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사강은 내내 모든 등장인물을 조소한다. 젊은 애인을 어떻게 해서든 잃고 싶지 않은 샤를의 어리석음("샤를은 2년 전부터 바보가 되어 있었다")을, 그와 마찬가지인 디안의 집착을, 루실의 지킬 수 없는 약속을("혹시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절대 우스워지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앙트완의 아집을 비웃고 있다.
그 서늘함을 즐길 사람이라면, 강추.

P.S.1. 이 포스팅에 등장하는 사진들은 모두 1968년 알랭 카발리에 감독에 의해 영화화된 <패배의 신호>의 장면들이다. 카트리느 드뇌브가 루실 역을, 미셸 피콜리가 샤를 역을 맡았는데 드뇌브야 누가 뭐랄 사람이 없겠지만 샤를이 전혀 미중년으로 보이지 않는 대머리 아저씨라서 실망. 1960년대 파리의 눈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던 것 같다(누군가 세계에서 가장 대머리에 관대한 나라가 프랑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 그 말이 맞는 지도).
게다가 디안 역을 맡은 이레느 툰치가 지나치게 미인이라 루실-디안의 대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첫 장면에서 카트리느 드뇌브가 입고 나오는 옷이 바로 오렌지색 니트 스웨터. 우연의 일치라기엔 매우 신기하게, 한국어 번역서의 장정 컬러와 같다.

P.S.2. 이 책을 흥미롭게 보신 분이라면 두 편의 다른 작품을 추천. 하나는 <롤리타>로 잘 알려진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어둠속의 웃음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 작가 에블린 워의 <한줌의 먼지>. 세 작품 모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녀간의 관계에 대한 냉철하고도 섬세한 분석이 일품이다.
세 권의 책을 읽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젊은 남자에게 빼앗긴 독일 중년 남자, 영국 중년 남자, 프랑스 중년 남자의 각기 다른 반응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P.S.3. <La Chamade>는 '퇴각 나팔'이라는 뜻이지만 '예기치 못한 감정의 격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La Chamade>의 영어 번역 제목으로는 주로 <Heartbeat>이 사용되는 듯 하다. 그 전혀 다른 두 의미가 같은 단어에 담겨 있다니, 프랑스어는 참 묘한 언어.
'뭘 좀 하다가 > 책도 좀 보다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취로 뽑아본 2024년 10권의 책 (3) | 2024.12.29 |
|---|---|
| 세설, 벚꽃이 지는 간사이의 봄날같은. (1) | 2024.12.29 |
| AI와 인간, 부모-자식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0) | 2024.02.15 |
| 개취로 뽑아본 2023년 10권의 책 (16) | 2023.12.30 |
|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를 읽고 (2) | 2023.08.27 |